|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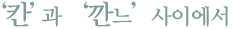 |
|
| 강재형(MBC 아나운서국 부장) |
|
 영화배우 전도연. 그가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대단한 일이다. 처음 참가한 국제 영화제에서 받은 상이어서 더 그렇다. 영화제의 황금종려상 작품은 크리스티안 문지우가 감독한 ‘포 먼스, 스리 위크스 앤드 투 데이스’. 한 해 수십 편 정도 제작되는 나라의 작품이라니 또한 대단한 일이다. 전도연이 여우주연상 받고 문지우의 영화가 황금종려상 받은 그 영화제는 칸 영화제.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에서 치르는 영화제이다. 지명은 분명 한 도시를 가리키는데, 방송과 신문에선 ‘칸’과 ‘깐느’가 혼용되었다. 앵커는 ‘칸 영화제에서는~’이라고 하고, 현지 특파원은 ‘깐느에서는~’이라고 한 뉴스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칸과 깐느의 ‘헷갈림 현상’이 드러나기 전, 내 블로그에서 ‘칸-깐느’ 표기 문제를 짚어본 적이 있다. 아래 내용이다.
영화배우 전도연. 그가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대단한 일이다. 처음 참가한 국제 영화제에서 받은 상이어서 더 그렇다. 영화제의 황금종려상 작품은 크리스티안 문지우가 감독한 ‘포 먼스, 스리 위크스 앤드 투 데이스’. 한 해 수십 편 정도 제작되는 나라의 작품이라니 또한 대단한 일이다. 전도연이 여우주연상 받고 문지우의 영화가 황금종려상 받은 그 영화제는 칸 영화제.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에서 치르는 영화제이다. 지명은 분명 한 도시를 가리키는데, 방송과 신문에선 ‘칸’과 ‘깐느’가 혼용되었다. 앵커는 ‘칸 영화제에서는~’이라고 하고, 현지 특파원은 ‘깐느에서는~’이라고 한 뉴스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칸과 깐느의 ‘헷갈림 현상’이 드러나기 전, 내 블로그에서 ‘칸-깐느’ 표기 문제를 짚어본 적이 있다. 아래 내용이다.
얼마 전에 본 어떤 신문의 전면광고. 텔레비전 수상기 광고다. '영화 보기'에 신경 쓴 제품임을 강조한 듯 '깐느'란 이름이 붙어있다. 영화제로 유명한 그 동네 이름 표기는 '깐느'가 아니라 '칸'이다. 어문규정에 따르면 그렇다.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Cannes’는 '깐느'나 '깐'이라 하지 않는다. 프랑스에 살았던 이에게 발음을 물어보니 '깐(느)'쯤 된단다. 그렇다면 '깐'이나 ‘깐느’로 적으면 된다? 아니다. 현행 외래어표기법의 프랑스어 편은 된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 수도를 '빠리'라 쓰지 않고 '파리'라 하듯, '깐(느)'도 '칸'이라 써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귀로 듣기에는 '쁘,뜨,끄'에 가까운 프랑스어 단어를 한글로 표기를 하게 되면 '프,트,크'로 쓰고 읽어야 한다.
'외래어는 현지발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프랑스어도 예외는 아닐 터인데 전문가들이 고민 꽤 했을 거다. 음성학의 전문 영역에서 보면 '깐느'보다 '칸'이 가까운 표기와 발음이라는 판단에 따라 결정했을 거라 믿는다.
언중에게 널리 알려진 '깐느'를 큼지막한 제목으로 뽑은 텔레비전 광고. 친근함과 분위기를 위해 그랬을 거라 눈 질끈 감고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 뒤에 '사연'으로 늘어놓은 글귀에 '설레임'이 눈살 찌푸리게 했다. '설레이다 - 설레임'이 아니다. '설레다 - 설렘'이 맞다. '설레이다는 설레다의 잘못, 설레다의 북한어'로 <표준국어대사전>은 설명한다.
깐느 → 칸, 설레이다 → 설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라면 우리말도 제대로 쓰기를 바란다. 그간 '제대로 해 온' 기업이기에 아쉬워서 한마디 했다. <강재형의 누리사랑방, 2007년 4월>
다시 영화제 얘기로 돌아가자.
큰상 받은 문지우 감독. 이름만 보면 ‘우리 핏줄’인 거 같지만 루마니아 ‘토종’이다. Christian Mungiu. ‘문기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문지우’와 ‘문쥬’도 일부 혼용되고 있다. 소리가 다른 외국말을 우리 문자로 완벽하게 ‘전사(轉寫)’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 ‘정한 약속(외래어 표기법)’을 지키면 될 일이다. 그런데 황금종려상 받은 영화 제목 '4 Months, 3 Weeks and 2 Days'의 번역도 매체마다 차이가 있다. ‘4개월, 3주, 그리고 2일’(스포츠조선), ‘4개월, 3주 그리고 2일’(마이데일리), ‘4개월, 3주 그리고 이틀’(문화방송), ‘4달, 3주 그리고 2일’(한겨레신문). 반점(,)의 쓰임과 ‘개월-달’, ‘2일 - 이틀’ 따위의 작은 차이가 눈에 띈다.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는 제목도 있다. ‘넉달 삼주 이틀’, 중앙일보가 옮긴 제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곧 개봉할 예정인 이 영화, 어떤 번역이 영화 느낌을 제대로 전할지 모르겠다. 몇 년 전 개봉했던 미국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이 문득 떠오른다. 희대의 사기꾼과 베테랑 FBI요원의 거짓말같은 실화를 그린 영화. 우리말 제목으로 ‘나 잡아봐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