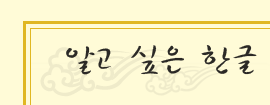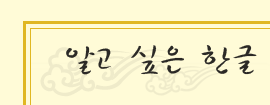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이
기 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이
表에서 영어의 f, v, l, th 등의 표기가 각별한 주의를 끈다.

이 表에는 이 밖에도 주의를 끄는 점이 많다. 여기서 길게 논할
여유가 없어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위에 든 예 중에서 파리 서쪽의 도시 Versailles를
표기한 漢字의 ‘斐賽’은 영어 발음 [ve:sai]를, 한글의 ‘ㅇㅂㅓ쎄일스’는 미국 발음
[verseilz]를 반영한 것으로 흥미깊다.
外來語 표기에 특수한 문자 또는 문자 결합을 쓰려는 이런 경향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이어졌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李鍾極의 ‘모던 朝鮮 外來語 辭典’(1937)은 그 당시의 여러
간행물에서 모은 예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 경향을 지지한 대표적인 예로는
최현배의 ‘한글갈’(1942)을 들 수 있다. 최현배는 광복 이후 문교부의 편수국장으로서
‘들온 말 적는 법’(1948)에 그의 주장을 담기에 이르렀다. [f] ㆄ, [v] ?,
[l] ?, [z][?] ?, 등.
그러나 조선어학회는 이미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6장에서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바 있었고 실제로
1940년에 결정되고 1941년에 공간된 ‘外來語 表記法 統一案’도 이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p]나 [f]는 구별 없이 ‘ㅍ’으로, [b]와 [v]도 ‘ㅂ’으로, [l]과
[r]도 ‘ㄹ’로, [z]와 [?]도 ‘ㅈ’으로 적도록 규정한 것이다.9)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어학회(한글 학회)의 원칙과 다른 최현배(1942)의 私案이 1948년에
문교부 안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뒤 1958년에 발표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에서 현용
24자만을 쓰는 원칙으로 되돌아갔다. 1986년에 공표된 문교부의 ‘외래어 표기법’도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리하여, 외래어 표기를
위한 새 문자의 추가가 없게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만약 외국어의 원음을 존중하여
새 글자의 추가가 허락된다면, 金敏洙(1973)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아마 한글의 字母數는
世界 모든 언어의 全音韻數만큼 늘려서 마련해 놓아야만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110면)
이것은 외래어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말미암은 것이다. 외래어도 국어 어휘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국어에서 발음되는 대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
| 9)
이 통일안에서 모음간에서는 [l]을 ‘ㄹㄹ’로, [r]을 ‘ㄹ’로 적어 구별하도 록 한
것은 옥에 티라 하겠다. |
|
7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