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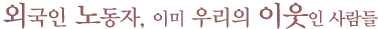 |
|
방영심(국립국어원 분석요원)
 “선생님 이거…….” 강의실 한쪽에서 한국어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내 앞에 내민 것은 건강 진단서였다. 내가 진단서를 훑어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내 얼굴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나 아파요?” 다행히 진단서에 건강이 의심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나는 괜찮다고 아픈 곳 없으니 안심하라고 웃어 주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로 쓰인 것들을 들고 와 읽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 매주 일요일,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그래서 정작 수업 시간보다 수업이 끝난 후가 더 분주하다.
“선생님 이거…….” 강의실 한쪽에서 한국어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한 사람이 내 앞에 내민 것은 건강 진단서였다. 내가 진단서를 훑어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내 얼굴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나 아파요?” 다행히 진단서에 건강이 의심된다는 내용은 없었다. 나는 괜찮다고 아픈 곳 없으니 안심하라고 웃어 주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 한국어로 쓰인 것들을 들고 와 읽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 매주 일요일,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은 그래서 정작 수업 시간보다 수업이 끝난 후가 더 분주하다.
내가 부평에 있는 미얀마 선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건 작년 7월이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5년부터 한국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국어 교실을 열었고, 나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처음엔 인천 남동공단의 교육지로 수업을 하러 다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부평의 미얀마 선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와 나는 그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7월 한낮의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부평역 부근에 자리 잡은 선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선풍기도 틀지 않고 있었다. 연방 땀을 닦아내는 나를 뒤늦게서야 발견하고 선풍기를 틀더니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주었다. 첫날, 한국어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12명의 교육생을 등록받았다. 다음주 일요일에 수업을 하러 갔더니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주에는 50명이 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남동공단으로 수업을 나가던 선생님 두 분의 시간을 조정하여 세 사람이 그곳 수업을 맡게 되었다.
교육지라고는 하지만 한글반 하나, 한국어반 둘에 겨우 칠판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다. 한글반에서 하나뿐인 칠판을 사용해야 하므로, 두 한국어반에서는 칠판조차 없이 선원 한쪽 귀퉁이에 각각 상을 펴놓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한 공간 안에서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반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며 수업을 해야 한다. 다른 반 선생님의 농담에 세 반 학생이 모두 웃기도 하고, 한 반의 사람이 나와 노래를 부르면 세 반 사람들이 모두 잠시 수업을 멈추고 손뼉을 치기도 한다. 또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앙에 모신 부처님께 참배를 하러 온 사람들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기도를 하고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그 사람들의 열정만큼은 대단하다. 잔업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요일에는 어디를 배웠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어서 이메일로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혼자서 한국어 단어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외우는 사람도 있다. 한번은 선원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얀마에서 결혼식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의 식이 거행된다고 한다. 오후에 올리는 식이 한국어 수업 시간과 겹쳤다.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러 갔다가 갑자기 결혼식 하객이 되어 신랑 신부가 던져 주는 사탕을 받아먹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학생 중 한 사람이 “오늘 수업 못해요?”라고 물었다. 결혼식이 빨리 끝나면 남은 시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 사람의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스님의 축사와 노래로 결혼식이 30분을 넘어가자 한숨 소리는 더더욱 커져갔다. 그 사람은 결혼식 때문이 아니라 한국어 수업 때문에 안양에서 부평까지 왔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뒷자리에 앉아서 그 학생이 만들어 가지고 다니던 단어장에서 틀린 것들을 고쳐 주는 것으로 그날 수업을 대신했다. 그때서야 그 학생은 한숨을 거두고 짜증스러워하던 얼굴을 고쳤다.
일요일마다 약속을 잡을 수도 없고, 주말 이틀 동안을 여행하는 것도 포기하면서도 그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것은 이처럼 일요일 수업만을 바라보고 먼 곳에서 와 기다리는 사람들을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부평의 미얀마 선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업 연수생들이다. 미얀마에서는 산업 연수생에게 한국에 파견되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한다. 자기소개, 가족 소개, 그리고 몇 가지 인사말이 전부였다. 그 몇 마디의 말을 외워서 들어온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는가? 내가 준비한 작은 시간이 그 사람들의 불안함과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왜 애써 공단지대까지 찾아다니며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거창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까지를 들먹이고 싶지 않다. 다만 이제 30만이 넘어 이미 우리의 이웃이 되어 버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있는 동안은 우리와 더불어 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산다는 건,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