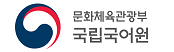온라인가나다 상세보기
한글 맞춤법 제 23항 붙임
'풋-사과'처럼 파생어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없으면 파생어가 아닌거잖아요? 그럼 '부스러기,기러기,딱따구리' 다 파생어가 아닌데 어디에 접미사가 붙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부스럭거리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 조항의 예시로 '부스러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동통신 기기에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한글 맞춤법 제23 항
안녕하십니까?
1. '부스러기/기러기/딱따구리'는 공시적으로는 단일어이나 통시적으로는 복합어입니다. 아래에 해당 어휘들의 어휘 역사 정보를 덧붙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명사 '부스러기'가 동사 '부스럭거리다'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스럭거리다'는 '마른 잎이나 검불, 종이 따위를 밟거나 건드리는 소리가 자꾸 나다 또는 그런 소리를 자꾸 내다'를 의미하므로 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는 '잘게 부스러진 물건/쓸 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의미상 '부스럭거리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스러기' 역사 정보 라기/락이/락(15세기)>바스락이(19세기)>부스러기(20세기~현재) 설명 현대 국어 ‘부스러기’의 옛말인 ‘라기/락이/락’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이 단어들 중 ‘라기’와 ‘락이’는 ‘라기’의 연철과 분철 표기의 관계이며 ‘락’은 이 단어의 형성이 의성 부사와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 합성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후 ‘’는 ‘ㆍ’와 ‘ㅿ’의 소실에 따라 2음절의 ‘ㆍ’는 ‘ㅡ’로 1음절의 ‘ㆍ’는 ‘ㅏ’로 바뀐 ‘바스락이’의 용례가 19세기에 보이며 현재 쓰이는 ‘부스러기’의 ‘부스’는 15세기 형태인 ‘라기’의 ‘’의 후대형일 가능성도 있으나 또 다른 의성 부사의 한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기러기' 역사 정보
그력(15세기~17세기)>그려기(15세기~17세기)>그러기(16세기~17세기)/기려기(16세기~17세기)>기러기(16세기~현재)
설명 | 현대 국어 ‘기러기’의 옛말인 ‘그력’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15세기에는 ‘그력’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그려기’ 형태도 나타난다. 16세기에는 ‘그려기’에서 제2음절의 반모음 ‘ㅣ’의 영향으로 제1음절에 반모음 ‘ㅣ’가 첨가된 ‘긔려기’ 형태와 제1음절의 모음이 ‘ㅣ’로 바뀐 ‘기려기’, 제2음절의 이중모음 ‘ㅕ’에서 반모음 ‘ㅣ’가 탈락한 ‘그러기’ 형태도 나타난다. 또한 ‘기려기’에서 제2음절의 반모음 ‘ㅣ’가 탈락한 ‘기러기’ 형태도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7세기까지는 ‘그력, 그려기, 그러기, 기려기, 기러기’가 공존하다가 18세기 이후로 ‘기러기’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
|---|
'딱따구리' 역사 정보
댓뎌구리(17세기)/뎌고리(17세기)/뎌구리(17세기)>닫뎌구리(18세기)>닷져구리(18세기~19세기)>져구리(19세기)>딱따구리(20세기~현재)
설명 | 현대 국어 ‘딱따구리’의 옛말은 17세기 문헌에서 ‘댓뎌구리’로 나타난다. 그런데 ‘뎌고리’, ‘뎌구리’와 같이 말도 같은 세기의 자료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댓뎌구리’는 ‘대+ㅅ+뎌구리’로 이루어진 복합어로 보인다. 18세기에 들어서면 ‘닫뎌구리’한 형태가 관찰이 되는데, 이것에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음절의 끝소리를 ‘ㅅ’으로 표기한 형태가 ‘닷져구리’이다. 첫째 음절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타나는 ‘져구리’란 형태는 19세기에 보인다. 딱따구릿과의 새에 해당하는 ‘까막저구리’가 ‘저구리’란 형태를 지니는 것이 이 말을 이해를 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